티스토리 뷰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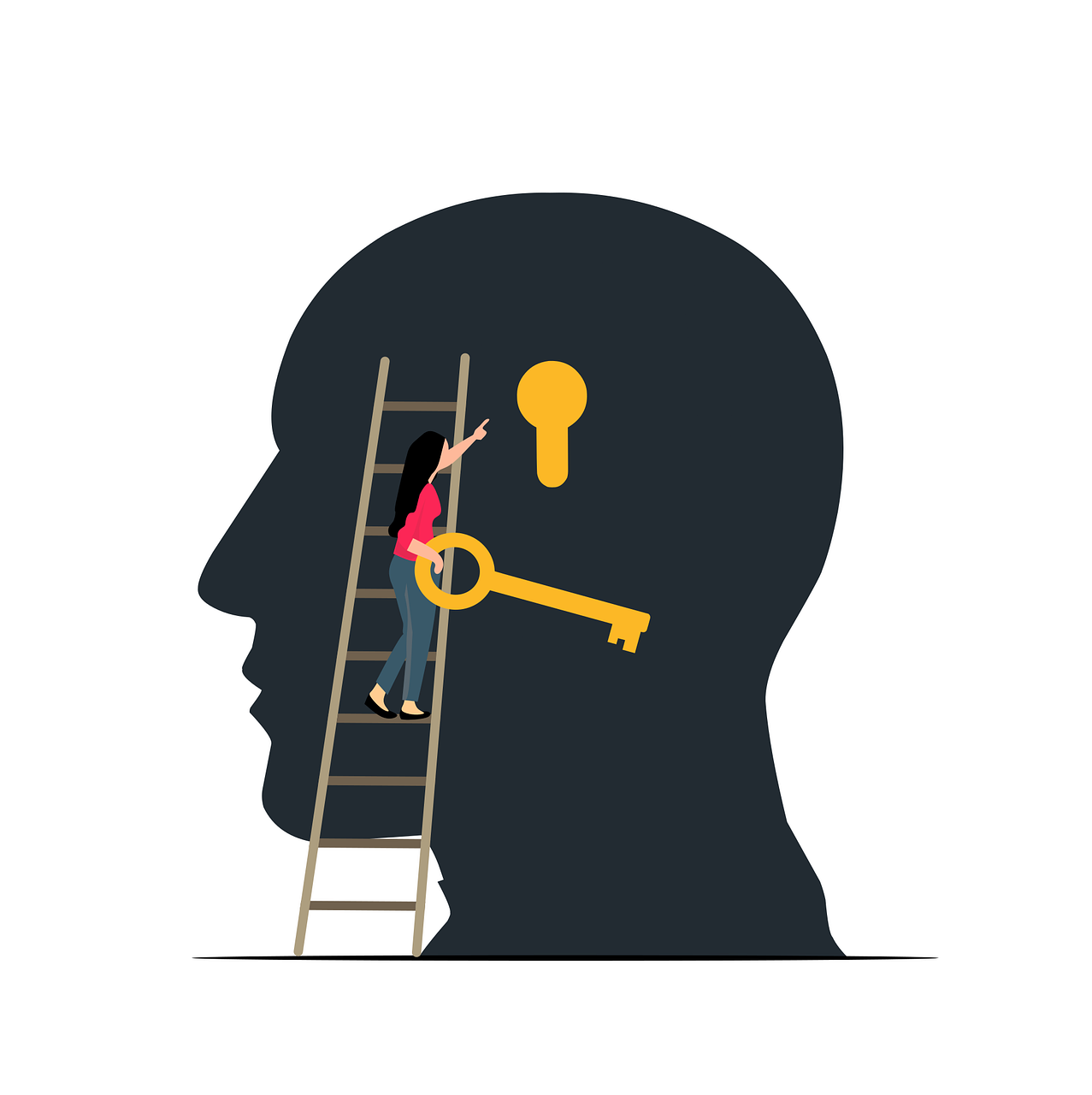
나는 27년째 상담을 해오고 있는 임상심리사다. 처음엔 내담자의 눈빛, 말투, 울음에 귀를 기울였다. 감정이 먼저였고, 뇌는 나에게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요즘은 자주 이런 생각이 든다. “감정을 품는 그릇이 뇌라면, 우리는 뇌를 모른 채 감정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이 글은, 실제 한국 상담 현장에서 뇌 기반 상담 적용사례의 접근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들이다. 그저 기술이 아닌, 살아있는 감정의 장면들. 그리움, 분노, 수치심, 그리고 변화의 반짝임이 담긴 기록이다.
🧠 한국 상담 현장 상담자들의 반응
-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는 뇌 기반 접근을 통해 자폐스펙트럼 청소년의 감각 과민을 조절하고, 자기조절 기능을 개선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음.
- 트라우마 전문 클리닉에서는 EMDR, 신체기반 기법(Somatic Experiencing), 그리고 감각 통합 놀이기법을 접목하여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불안 감소에 기여.
- 학교 현장에서는 스트레스 바이오피드백 기기를 통해 시험 전 긴장 완화, 감정표현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뇌파 패턴 조정 적용 시도 중.
🧠 사례 1. “불면과 불안에 갇힌 40대 여성 -감각 통합과 신경 조절의 만남”
K 씨는 2년째 불면증과 만성 불안을 겪고 있었다. 내담자는 잠에 들기 전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과거의 장면이 무작위로 떠오른다고 호소했다. 불면에 대해 CBT-I(인지행동 기반 수면치료)도 적용했지만, 뇌의 과각성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선택한 접근은 감각통합 기반 자율신경 조절 개입. 치료실 한편에 둔 조도 낮은 램프, 중력 담요, 그리고 헤드폰으로 들려주는 자연음. 말로 풀지 못하는 긴장을, 몸의 감각을 통해 우회로로 진정시키는 방식이었다. "나는 치료실에서 처음으로 숨이 깊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 K 씨의 6회기 말, 그녀의 심박 수는 안정되었고, 불면의 패턴도 점차 바뀌었다. 전두엽으로 접근할 수 없던 불안은, 감각-뇌간-시상-변연계 루트를 통해 조절되기 시작했다.
🧠 사례 2. “자해를 반복하는 10대 — 브레인스폿팅과 기억의 재배치”
고등학교 2학년인 Y군은 손목에 자해 상처를 남기며 상담실에 들어왔다. 언어적 표현이 어려웠고, ‘나쁜 기억이 계속 떠오른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때 활용한 기법은 브레인스팟팅(Brainspotting). 트라우마의 ‘고정된 신경 경로’를 시각적 고정점과 함께 찾아내고, 그것을 조용히 관찰하는 시간. "선생님, 눈을 그쪽에 두고 있으면 그때 생각이 나는데… 이번엔 눈물이 나진 않아요." Y군의 기억은 이제 감정을 동반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뇌의 해마-편도체 연결 회로가 약화되고, 감정 반응이 점진적으로 탈감작된 결과였다. 말이 필요 없는 장면. 뇌는 스스로 회복을 기억하고 있었다.
🧠 사례 3. “감정을 억누르던 50대 남성 — 뇌파 피드백과 감정의 귀환”
J 씨는 ‘나는 감정이 없다’고 말했다. 회사를 다니며 누구에게도 감정을 보이지 않으며 살아온 사람. 그는 상담실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말없이’ 보냈다. 감정 기록지도 무의미했다. 이때 시도한 것은 뇌파 피드백(Neurofeedback). 이마 부위에 센서를 붙이고, 뇌의 α파, β파를 모니터링하며 영상 피드백을 제공했다. 어느 지점에서 J 씨의 전두엽 활동이 급격히 떨어지고, 해마 부위 감각이 증가했다.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 사진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있었던…"
뇌의 연결이 다시 시작될 때, 감정은 돌아온다. 뇌는 잊지 않는다. 단지, 안전하지 않았을 뿐. 뇌 기반 상담은 말이 닿지 않는 내면에 ‘비언어적 손’을 내민다.
💬 마무리 — 뇌가 말을 걸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는 늘 “감정을 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감정은 뇌가 보내는 전기적 시(詩)다. 우리는 그 시를 해독하는 번역가여야 한다." 이제 상담자는 단순히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뇌파의 리듬을 읽고, 감각의 진동을 느끼며, 언어 이전의 언어를 해석하는 존재다. 말할 수 없던 고통, 설명되지 않던 분노, 떠오르지 않던 기억. 그것들은 뇌에 남아 있었고, 우리에게 말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뇌 기반 상담은 그 말 없는 메시지를 듣는 새로운 귀다. 그리고 한국의 상담 현장은, 그 귀를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 기록하는 임상심리사, 마음과 뇌 사이에서 작은 반응을 관찰하며
